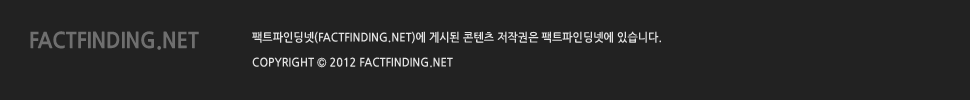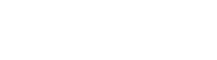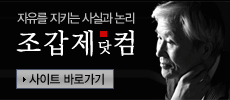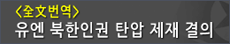|
제1차 인민혁명당 (인혁당)사건 |
![인혁당[1].jpeg](/up_fd/Issue/인혁당[1].jpeg)
|
| 남파간첩 김영춘에 포섭된 도예종, 김영광 등이 50여명의 조직원을 규합,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토대로 작성한 정강(政綱)으로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정권타도 등 각종 反정부투쟁을 전개하며 국가변란을 획책해오다 1964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사건이다. |
|
- 사건설명 - |
| ■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중정‧中情)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래 2007년 1월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43년간 조작여부를 둘러싸고 줄기차게 논란을 빚은 공안사건이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1차 사건이 발표됐으며, 1974년 2차 사건이 발표됐다. 1차 사건은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을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 계엄이 선포됐던 6‧3사태 당시 발표됐다. 1964년 8월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기자회견을 통해 4‧19직후 조직된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과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그리고 사회대중당과 진보당 및 빨치산 출신들이 김영춘(金永春, 남파간첩)의 지도아래 인혁당을 결성하고 학생시위를 배후에서 조종, 정부타도 운동을 벌이게 했다고 발표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인물은 우동읍(禹東邑, 본명 우홍선, 무죄 판결 받은 뒤 월북), 김배영(金培永, 무죄 판결 받은 뒤 월북), 김영광(金永光, 이상 통민청 출신인사), 김금수(金錦守), 도예종(都禮鍾, 이상 민민청 출신인사), 허작(許灼, 사회대중당), 김한덕(金漢德, 진보당), 박현채(朴玄埰, 서울대 상대 강사)였다. 중정은 “인혁당은 학생담당부서인 중앙학생지도부로 하여금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조직들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련) 대표 박범진(朴範珍), 불꽃회 대표 김정강(金正剛),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대표 박한수(朴漢洙) 등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는 양으로 가장, 배후에서 시위를 선동해 3‧24데모를 유발시켰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혁당 주동자들은 당(黨)운영 자금을 받기위해 교양위원 김배영(金培英)을 1962년 10월 일본 경유로 월북시켰다는 것이다. 中情은 이 사건 관련자 57명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도피한 16명은 전국에 수배했다고 밝혔다. ■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은 중정의 발표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공안부가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기소를 거부했다. 담당 검사들은 약 2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중정이 발표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중정은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조서만 넘겼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행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검찰수뇌부는 구속 만료일인 9월5일에야 사건담당 검사가 아닌 당일 숙직근무자인 서울지검 정명래(鄭明來) 검사로 하여금 관련자 2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케 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공안부 담당검사 4명 중 이용훈(李龍薰) 부장검사와 김병리(金秉离), 장원찬(張元燦) 검사 3명 등은 이에 반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파동’이 일어났다. 검찰 수뇌부는 하는 수 없이 서울고검 韓沃申(한옥신)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수사토록 조치, 한 검사는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13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보법 위반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적용법률을 바꾸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재판장: 김창규(金昌奎) 부장판사]는 1965년 1월 반공법 제4조를 적용, 도예종(都禮鍾)에게 징역3년을, 양춘우(楊春遇)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임창순(任昌淳) 등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예종-양춘우 두 피고인이 북한의 위장된 민족자주적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단체의 구성을 예비음모한 점 등의 증거를 인정했으나 임창순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사실이나 북한을 이롭게 할 단체의 구성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965년 5월의 항소심 판결은 원심을 파기,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鄭台原) 부장판사]는 이들 전원이 1961년 10월경부터 민정이양 후에 혁신계 정당 활동이 허용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민주자주평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서클을 조직, 활동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관련 피고인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다음 “이들이 혁신계의 모체로 조직한 서클의 조직 확대, 당명, 강령 등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도예종은 징역 3년, 박현채, 정도영, 김영광, 김한덕, 박중기, 양춘우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965년 9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낸 상고를 전부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은 약 1년 만에 마무리됐다. ■ 관련인물: 박현채(朴玄埰)와 인혁당의 관계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관련된 박현채(朴玄埰, 1934~1995)의 혐의는 도예종(都禮鍾)을 은닉한 혐의였다. 인혁당은 조직되지도 않았고 反국가단체도 아니라는 것이 1심에서 대법원까지 일관된 판결이었으므로 박현채 역시 단순한 범인 은닉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박현채의 역할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박현채는 전남 화순군 출생으로 광주 수창초등학교 재학 때부터 독서회 활동과 동맹휴학 주도로 두각을 나타났다. 광주서중학교 재학 때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비밀 외곽조직인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의 세포 조직으로 활동했다. 6‧25전쟁 기간 북한군이 패퇴한 1950년 10월 16세의 나이로 입산, 1952년 8월까지 약 2년간 빨치산 활동을 벌였다. 처음에는 전남 무등산과 백아산에서 연락병 노릇을 하다가 20세 미만의 소년들로 편성된 소년돌격부대의 문화부 중대장으로 활동했다. 훗날 그는 조정래의 장편소설《태백산맥》 제9권 첫 머리에 나오는 ‘위대한 전사 조원제’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빨치산 활동 중 복부관통상을 입은 박현채는 하산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다음 풀려나 전주고등학교 3학년에 편입, 졸업 후 1955년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1961년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 한국농업문제연구회 간사 일을 보면서 자본주의와 세계경제, 한국경제 연구에 몰두했다. 1963년에는 모교 강사가 됐으나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그만두게 된다. 1971년《김대중 씨의 대중경제론 100문 100답》을 집필했으며, 1978년에는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비판한《민족경제론》을 출간했다. 1979년에는 ‘임동규간첩사건’(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구속됐다. 이후 박현채는 1980년 민주화를 주장하는 ‘134인 지식인 선언’에 참여하고 1989년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되어《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을 출간해 명성을 날렸다. 1950년대 말부터 박현채와 인연을 맺은 김낙중(金洛中, 간첩사건 연루자, 前 민중당 공동대표)은 자신이 1961년 10월 군에 입대하게 되자 박현채를 포함한 동지 6~7명이 그를 환송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은신처에 모였다. 이들은 여기서 비밀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김낙중에 따르면 월남전쟁이 한창일 때 박현채는 (북한군이) 전선을 밀고 내려오는 정규전 방식에 의한 해방투쟁이 미국의 간섭으로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는 월남에서와 같은 유격투쟁에 의한 통일투쟁이 불가피하므로 미국을 상대로 하는 민족해방투쟁의 제2전선을 한반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작원들의 1‧21청와대습격미수사건이 발생하고, 울진, 삼척 등지에도 무장공작원들이 나타나자 이에 고무된 박현채는 1969년 분명히 통일을 위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해 여름 김낙중과 박현채는 둘이서 술 한 잔씩을 하면서 내기를 걸었다고 한다. 그 해 안에 북한 공작원의 유격투쟁이 확대되면 김낙중이 술을 사고, 유격투쟁이 확대되지 않으면 박현채가 술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격투쟁은 ‘확대’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현채는 1970년과 1971년 까지도 유격전 확대에 대한 기대를 포기 하지 않고,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인 박중기(朴重基, 前 한국여론조사 취재부장, 現 4‧9통일평화재단 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현채는 유신 이후에는 해방투쟁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8인 중 하나인 이수병은 조직을 갖추어 당장 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박현채의 경우 객관적 조건과 변혁 주체의 능력을 냉철하게 평가하지 않고 조직부터 만드는 것은 오히려 큰 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박현채는 그의 민족경제이론 뿐 아니라 사회구성체이론으로 한국의 좌파혁명세력에 영향을 끼친 좌파이론의 대부였다. 2006년에는 모두 7권에 달하는 《박현재 전집》이 출간되고, 2007년 9월에는 좌파경제학자들이 그를 기리는 학술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박현채와 함께 지하 운동을 벌인 임동규[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연루자]는 박현채가 당시 학생, 노동, 농민, 여성 등 각 분야의 운동책임자들에게 투쟁방향을 지도함으로써 남한 변혁운동의 보이지 않는 사령탑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좌파성향 저술가인 김기선은 박현채가 생전에 “기회가 닿는 대로 도예종, 최백근, 우동읍(본명 우홍선)등 당대의 변혁운동가들을 만나 운동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했다.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간 《희망세상》2006년 2월호,「한국 민중운동사의 거대한 뿌리 박현채1」, 7페이지) 이들 가운데 도예종의 경우 1948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하다 1960년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경북 간사장을 지냈으며, 1964년 7월 북한간첩 김배영, 김규칠 등과 함께 인민혁명당을 조직, 지하활동을 하다가 피검(被檢) 형(刑)을 산 인물이다. 도예종은 인혁당 사건 이후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다시금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이듬해 사형됐다. 도예종은 인혁당 재건위 이외에도 서도원, 하재완 등과 함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도 관여했었다. 도예종이란 이름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말기에 발생한 최대 공안 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도 등장한다. 남민전 사건 연루자들은 남한에서 공산혁명이 이뤄지면 북한군에 지원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혁명이 성공하면 중앙청에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 조직을 상징하는 깃발)를 준비했다. 전선기의 상부는 적색(赤色)으로 해방된 지역인 북한을, 하부는 청색으로 미(未)해방지역인 남한을 상징하며, 중앙의 붉은 별은 사회주의 혁명의 희망을 의미했다. 문제의 깃발은 사형당한 도예종 등 소위 ‘8열사’가 입었던 내의를 염색한 천으로 만들어졌다. |
하단주메뉴